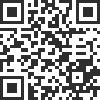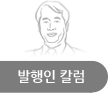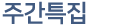|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대부분의 나라에서 빛공해에 대한 관심은 인공조명으로 인해 별자리와 은하수 등 밤하늘 조망에 방해를 받으면서, 어두운 하늘을 보호하려는 운동(dark-sky movement)에서 시작됐다. 1988년부터는 국제암전협의회(IDA :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가 만들어져 국제조직으로 활동되고 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에 따르면, 해외 각국의 빛공해에 대한 제도들은 대부분 천체 관측소가 있는 지역에서 지방조례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이후 빛공해가 천체관측 뿐만 아니라 야생동식물 환경에 영향을 주고, 주거지의 빛침입이나 눈부심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게 됨을 인식하게 되면서 빛공해 방지법이 확산됐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빛공해를 인식하는 관점과 정도에 따라 빛공해 방지법의 규정이나 관리방안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본은 1988년부터 빛공해와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전국 일반시민이 참가하는 ‘전국밤하늘계속관찰’이 열리면서 본격화됐다. 1989년에는 오카야마현의 미세이치쵸에서 ‘아름다운 성공(星空)을 지키는 미세이쵸 광해방지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그 후 각 지역에서도 빛공해 관련 조례들이 제정됐고, 1998년 중앙정부 차원의 광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빛공해 영향 대상을 동식물과 인간 생활으로 나누고, 새는 빛을 억제, 감수성이 높은 파장대의 빛 억제, 점등 시간의 검토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조명계획을 세울 때도 4단계의 조명환경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이미지 및 목표환경을 설정해 관리학 있다. 이는 국제조명위원회가 제시한 Lighting Zone에 따른 것으로 △안전한 조명환경, △안심스런 조명환경, △평안한 조명환경, △즐거움의 조명환경을 지역별로 나누고 있다.
미국의 빛공해 관련법은 1972년 아리조나 주에서 시작됐다. 인공빛으로 인해 천체관측이 어려움을 겪었던 아리조나주 투손시에서 인공빛을 제한하는 조례와 도로조명의 조례가 함께 제정됐다. 그 후 각 주에서 빛공해 관련 법규들이 생겨났지만 목적은 조금씩 달랐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빛공해 눈부심과 새는 빛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메인 주에서는 ‘눈수심과 새는 빛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빛공해 관리 조례의 경우도 주와 도시별로 다르나 주로 ‘Lighting zone’방식이 쓰인다. 용도지역제와 같이 지역특성에 따라 존을 설정하고, 각 존별로 허용조도, 조명시설 설치기준, 광고조명 규제 등을 적용한다.
[자료=한국도시행정학회]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Lighting zone’을 야생과 공원지역의 경계 및 전원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공원, 여가지역과 야생보호 지역은 Lighting Zone 1으로, 전원 및 교외지역은 Lighting Zone 2, 도시지역은 Lighting Zone 3, 특별 구역은 Lighting Zone 4로 나누어 관리된다. 이는 국제조명위원회(CIE)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슷하다. 매우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판단에 따라, 상향조정 및 하향 조정 설계가 가능하다. 각 존에 따라 빛의 조도 뿐만 아니라 조명시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조명갓을 씌우는 방법, 사용 램프의 규정 등을 통한 기술적 규정도 포괄하여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 저감대책을 동시에 담고 있다.
영국에서도 오랫동안 천문관련 단체와 농촌 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빛공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2005년, 인공조명으로 인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례가 시행됐다. 이 조례의 경우, 타인에게 위해한 빛, 즉 눈부심 발생이나 빛의 침입(trespass)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이 조례는 지역보다는 조명의 사용용도로 나누어 관리했는데, 가정의 안전을 위한 조명, 상업적 안전을 위한 조명, 건강생활과 스포츠 시설을 위한 조명, 가정에서 장식을 위한 조명, 빌딩의 외관조명과 경관조명 등이 해당한다. 각 용도의 조명은 세기, 시간, 종류 등 준수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상업적 안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규정에서 관련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빛공해 관리의 목적과 법규의 형태도 각 각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빛공해 관리 목적을 정리하면, △암천보호, △동식물 생태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주거지의 빛침입, △눈부심으로 인한 장애 등 사회적 영향의 최소화, △에너지 효율 관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형태는 크게 ‘Lighting zone System’의 채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생활에서 야간조명의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조명의 관리도 중요해졌다. 이에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쾌적한 야간환경 조성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빛공해 방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